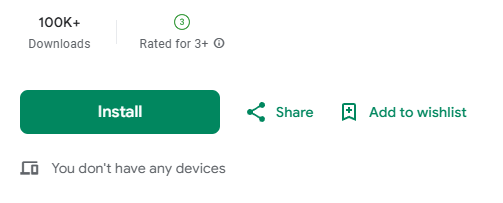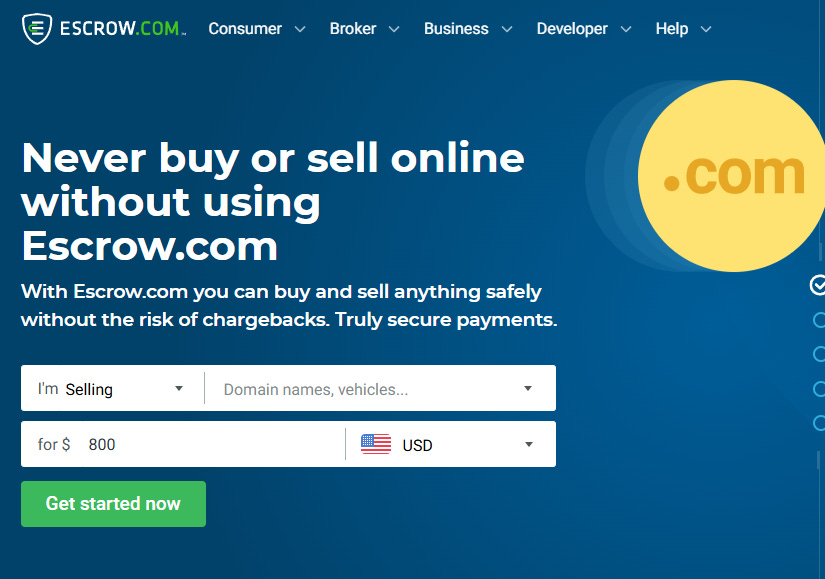2021년, 나는 브라질 개발자의 안드로이드 앱을 샀었다!
도망쳐나온 인수창업 사냥터로 다시 간다면..?
안녕하세요, 진양입니다!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어느새 긴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 긴 연휴의 마무리를 제 덤덤한 편지로 하시게 된다니, 책임감이 막중해집니다!
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내일 출근 준비를 위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 인수창업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초창기 에피소드를 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자그마치 2021년, 제가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개념을 처음 깨달았던 시기.
그때 제가 처음 인수한 매물은 지금처럼 온라인 커머스가 아닌, 하나의 작은 앱이었습니다.
당시 sideprojectors라는 아주 날것의 느낌이 나던 온라인 개발자 포럼에서 한 브라질 인디 개발자가 만든 안드로이드 앱을 샀습니다.
당시에 3만 명 조금 넘는 다운로드 수, 월 활성 사용자는 약 4천 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엄청 니치한 유틸리티 앱이었고, 기능이나 UX도 단순했지만..
ASO 상으로는 그래도 니치한 키워드에서 1~2위를 왔다 갔다 하던 앱이었죠.
그땐 인수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아서, 그냥 “사용자 수 대비 가격이 싸네?” 하는 단순한 이유로 샀습니다. 제 기억에 월 활성 사용자 4천명 정도? 그때 100만 원 정도에 인수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엄청 세부적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의 두려웠던 감정은 기억나네요.
그래도 온라인 포럼에서 알게 된 인디 개발자였고, 업자 느낌은 전혀 없어서 마음이 조금은 편했어요. 판매자도 첫 판매, 매수자도 첫 매수라.. 마치 초보끼리 만난 느낌이랄까요.
당시에 모바일 앱 실사를 위해 관리자 페이지랑 Firebase Analytics 권한을 받아 데이터를 봤는데, 사실 그때는 뭘 봐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ㅋㅋㅋ
그래서 그냥 “죽은 앱은 아니구나” 정도만 확인하고, 흥정도 없이 바로 샀어요.
당시엔 ‘국제 거래로 모바일 앱을 사본다’는 경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주 나이브한 Plan B도 있었어요..! “3천명 월 사용자 사용자 위에 구글 애드 붙이면 금방 회수하겠지..?”
실제로 AdMob 수익 예측 툴 돌려보니 5~6개월이면 원금은 충분히 회수 가능할 것 같았고.. 그래서 이건 ‘잃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100만 원 잃어도 남들은 못한 경험을 사는 셈이니까요.
시간이 흘러서 결과적으로 이 매물의 수익화 프로젝트는 드랍됐고 회수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국내에서 크로스보더 앱 인수를 직접 해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죠.
물론 인수 금액은 제가 제일 낮았겠지만요. ㅋㅋㅋ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 첫 ‘성공적인’ 인수는 아동 타이즈 프로젝트였지만, 정작 제 첫 인수는 제 원래 직업과 맞닿아 있는 모바일 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양님은 개발자셨는데, 어떻게 커머스를 인수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전 평생 개발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첫 ‘성공적인’ 인수는 온라인 기반의 웹이나 앱일 거라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 시절엔 ‘충성 고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로쓰는 시킬 수 있다’는 개발 외 영역에서도 엄청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무서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첫 모바일 앱을 인수해보니, ‘서비스를 잘 개선하는 것’과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더라고요. (스킬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당시에 수서역 로즈데일 사무실 월세 청구서와 비어가는 통장잔고를 보며 “내가 지금 앱을 개발하고 있는 게 맞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동시에 밀려오면서...개발에도, 사업에도 집중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완전히 헤맸죠.
물론 지금도 ‘개발자 출신 인수창업가’로서의 엣지를 살리려면 남들이 편하게 다루지 못하는 테크 중심 매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엔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디지털 앱이나 SaaS 인수는 잠시 묻어두기로 했죠.
가장 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 개인 자본으로는 고정비를 감당할 만한 매물을 인수하기가 불가능했어요. 동업자 두 명의 인건비, 수서역 로즈데일 오피스텔 월세까지…매달 쌓이는 청구서에 눌리다 보니, 사용자 3~4천 명짜리 앱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온라인 사업으로 고정비 다 커버하러면 적어도 잠재시장이 좀 큰 매물 하나를 사거나, 아니면 아예 니치하더라도 고객 공감대가 높은 섹터에서 동시에 4~5개를 돌려야 고정비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괜찮은 앱들은 죄다 억 단위부터 시작하니,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묻게된 두 번째 이유는, 인수창업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 당시 팀의 불안감이었습니다. 기본 불안 수치가 높다보니, 멀티플이 높은 매물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본능적으로 두려웠어요. 당시 해외 앱 매물들의 보통 회수 기간이 5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앞으로 5년 동안 이 앱이 살아 있을까? 경쟁사가 치고 들어오면? 이 도메인이 성장 가능성이 있나? 등등..
IRR, 자유현금흐름 같은 기초적인 재무도 모르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직감적으로 “이게 과연 좋은 투자일까?”라는 의문은 있었습니다.
특히 회수 3~5년이라는 것도 ‘앞으로 성과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나온 수치였는데, 실제로는 매출이 6개월도 안 찍힌 매물들이 대부분인 것도 한몫 했고요.
마치 RPG 게임에서 6레벨 도적이, 42레벨 전용 도적 특화 사냥터에 가서 사냥 해보겠다고 버텨보겠다는 격이랄까요? 사냥터에 적합한 스킬셋이 있다고 해도, 레벨부터 맞춰야 사냥이 되는 법이죠.
결국 저는 ‘조금 더 경험을 쌓고 나서 모바일 앱이나 SaaS를 다시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수한 사업체들을 기반으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구조상, 내재화된 Growth 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 커머스만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앱까지 커버하는 Micro PE로 확장할 것인지.. 이 방향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성장 엔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커머스만 계속 간다면 DTC 브랜드 역량과 물류/수입/수출 역량을 키우면 되겠죠. 하지만 그 업사이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 팀만의 엣지를 살려 앱이나 SaaS를 중심으로 인수하고 커머스를 ‘양념’처럼 다루는 팀이 된다면, 내재화해야 하는 엔진 역량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미래의 밸류에이션도, 리스크도, 필요 자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6년 뒤 10억짜리 회사를 만들 것인가, 5,000억짜리 회사를 만들 것인가..
여튼.. 명절이 끝나면 동업자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요. 향후 회사의 운명을 책임질 그로쓰 엔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 고민의 시작점이 어쩌면 2021년 그 작은 앱 인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해답도 어쩌면 그 안에 있으려나 싶어서, 오늘은 잠시 그 시절의 추억을 꺼내봤습니다.
그때의 ‘사기당해도 상관없다’던 도전적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랩업한 캐릭터를 들고, 예전에 도망쳐나왔던 그 사냥터를 다시 레이드하러 가게 될지? 한번 지켜봐주세요!